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하거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면서 “주거급여가 끊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크거나 주택 구입 후 재산이 늘어나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불안해하시죠.
이 글에서는 전세 주거급여 조건부터 자가 구입 시 달라지는 지원 방식,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탈락 조건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주거 형태 변화에 따른 주거급여 영향을 미리 파악해서 현명한 주거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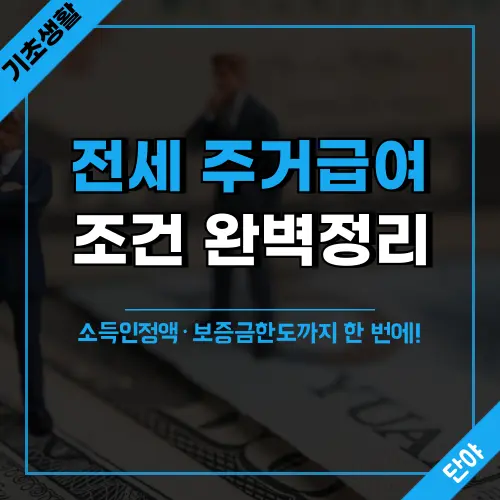
전세 이사 시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계획할 때 주거급여 지원이 계속 가능한지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로 이사해도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점을 이해하셔야 해요.
전세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전세는 월세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임차 형태이므로 임차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거급여법에서 정의하는 ‘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연 4%로 계산해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월 환산액은 약 67만원(2억×0.04÷12개월)이 되는 식이죠.
✅ 전세 임차급여 지급 기준
- 전세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실제 임차료 산정
-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 기준으로 지급
-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후 지급
-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
월세와 전세의 주거급여 계산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지급 방식에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월차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되지만, 전세는 보증금분으로만 지급되죠.
월세 거주자가 월차임 40만원, 보증금 3000만원인 집에서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에 따라 월차임 4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를 보증금분으로 받게 됩니다.
반면 전세 거주자는 보증금 환산액 전체가 보증금분으로 지급되므로, 매월 일정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에요.
💡 전세 주거급여 지급 예시
수원 거주 3인 가구가 전세보증금 6000만원으로 계약한 경우:
- 실제 임차료: 20만원 (6000만원×0.04÷12개월)
- 2급지 3인 기준임대료: 37만 5천원
- 실제 임차료가 더 낮으므로 20만원 기준으로 급여 산정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른 주거급여 영향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주거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의 경우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받게 되거든요.
1급지(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5만 2천원이므로, 전세보증금이 약 5억 3천만원을 넘으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전세 수준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가 주택 구입하면 주거급여 어떻게 달라지나요?
내 집을 갖게 되면 주거급여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현금으로 임차급여를 받는 대신, 집수리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전환되죠.
현금 지원에서 집수리 지원으로 변경
자가 소유자는 매월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원), 중보수(1095만원), 대보수(1601만원) 범위에서 실제 수리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지원 주기입니다.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마다 한 번씩만 받을 수 있어요. 월세나 전세에서 매월 받던 임차급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경보수: 590만원 (3년 주기)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1,095만원 (5년 주기)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1,601만원 (7년 주기)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
- 소득수준에 따라 80~100% 차등 지원
재산 증가로 인한 소득인정액 변화
집을 구입하면 재산이 크게 늘어나므로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총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억원 주택을 구입했다면,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넘는 1억 100만원에 대해 월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월 약 10만 5천원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식이에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예시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2억원 주택 구입 시:
- 주거용재산: 2억원
- 기본재산액 공제: 9,900만원
- 소득환산 대상: 1억 100만원
- 월 소득환산액: 약 10만 5천원 (1억100만원×1.04%)
주거급여 탈락 가능성 검토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약 115만원을 넘으면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소득이 50만원이었다면, 재산 증가로 인한 소득환산액이 65만원을 넘지 않아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소득인정액이 76만 5천원(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감액되기 시작하고, 115만원에 가까워질수록 급여액이 줄어들다가 최종적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을 계획하실 때는 주택 가격과 기존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거급여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주거급여 탈락 조건 총정리
주거급여 탈락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에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죠.
소득인정액 구성 요소와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보면, 서울이 9900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기본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주거용재산 환산율 | 월 1.04% | 월 1.04% | 월 1.04% | 월 1.04% |
| 일반재산 환산율 | 월 4.17% | 월 4.17% | 월 4.17% | 월 4.17% |
구체적인 탈락 기준과 감액 기준
1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이 76만 5천원을 넘으면 주거급여 감액이 시작됩니다. 이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완전 탈락되는 기준은 114만 8천원(중위소득 48%)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주거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죠.
감액 구간에서는 초과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이라면, 76만 5천원을 초과한 13만 5천원의 30%인 약 4만원을 차감하게 되는 식이에요.
💡 소득인정액별 주거급여 지급 현황
- 76만 5천원 이하: 주거급여 전액 지급
- 76만 5천원 초과~114만 8천원: 초과액의 30% 차감 후 지급
- 114만 8천원 초과: 주거급여 완전 탈락
실제 적용 사례로 보는 탈락 시나리오
사례 1: 전세 이사로 인한 탈락 월급 60만원을 받는 1인 가구가 월세 50만원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으로 이사한 경우를 살펴보죠.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60만원으로 주거급여를 전액 받았는데, 전세보증금 2억원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서울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넘는 1억 100만원에 대해 월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월 약 10만 5천원이 추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죠.
총 소득인정액이 70만 5천원(60만원+10만 5천원)이 되므로 여전히 감액 기준인 76만 5천원 이하여서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자가 구입으로 인한 탈락
같은 조건에서 3억원 주택을 구입한다면 어떨까요? 기본재산액을 넘는 2억 100만원에 대해 월 약 20만 8천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총 소득인정액이 80만 8천원이 되어 감액 기준을 넘게 되죠. 이 경우 초과액 4만 3천원의 30%인 약 1만 3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5억원 주택을 구입한다면 소득환산액만 월 41만 6천원이 되어, 총 소득인정액이 101만 6천원이 됩니다. 아직 탈락 기준인 114만 8천원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감액이 이루어지겠죠.
마무리
지금까지 전세보증금과 자가 구입이 주거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변화에 있다는 점이죠. 전세는 여전히 임차급여 대상이지만, 자가 주거급여로 전환되면서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거 이동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먼저 본인의 소득과 예상 재산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콜센터(129)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